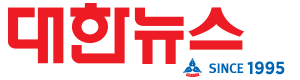전흥규 시인이 제10회 고운 최치원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고운 최치원문학상은 계간 <문장21>사가 2008년 제정, 매년 활발한 작품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중견 문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문걸 시인(동의대학교 명예교수)은 전흥규 시인을 “각종 지면을 통해 충분한 작품성을 인정받은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12월 7일 부산 블래어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번 최치원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전흥규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시가 늘 불온하고 그늘진 곳에서, 불현듯 눈부신 깨달음에서, 체온 따스한 온기에서 온다면, 시는 지금 내 안에 없다”고 자조하면서 “시에게서 한 번도 도망친 적 없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제대로 부지런을 떨어보지 못했다는 데 새삼 부끄럽다”며 수상을 채찍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전흥규 시인은 일상에서 만나는 대상과 현상을 섬세한 눈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와 상상으로 확장시키는 작품을 쓰고 있다. 단순하고 얕은 듯한 그 작품 속에는 차분하게 삶을 승화시키는 소시민의 시대적 깨달음이 숨겨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경구 같은 시어들을 만나게 된다.
신기용 문학평론가는 “그의 작품들은 수준 높은 시적 상상력과 공감각적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인간의 감각 기능을 상상력과 잘 버무려서 시적 이미지를 극대화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톡톡 튀는 리듬과 공감각적 이미지에 자꾸 여운의 시선이 머무는데, 이는 시어의 조탁 능력과 기교가 참신하기 때문이다”고 극찬했다.

전흥규 시인은 1961년으로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해서는 ‘방송대문학상’ 시 부문과 평론 부문에서 연연으로 장원을 했다. ‘풀밭동인’으로 활동했으며, 계간 <문장 21>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사)우리시진흥회 회원이며, 시집으로 <기다리는 것은 가면서 온다>(말벗)가 있다.
전흥규 시인의 시 몇 편을 소개한다.
접힌 곳은 검다
접힌 모든 것은
금 따라 어두운 빛 품는다
높고 가파른 바위도
접힌 곳으로 검은 무게 흘리고
두런거리던 바람도 그곳에 앉아 죽는다
골바람 일으키던 먼 산도
빛 가둬 풍문 가득한 물길 내고
꼿꼿이 선 나무도
살 주름에 흙먼지 담고 산다
전깃불 업고 흘러나온
너의 마을도
골목에 이르러 빛 접는다
그늘진 곳으로 횡단보도도 낼 수 없어
늘 월경을 꿈꾸고
외돈 마음까지 접혀 들면
짙은 어둠 품어 습한 몸으로
나는 쉬 제 빛 내지 못한 채
유행에 잡힌 옷깃에 꽁꽁 숨는다
스스로 가볍게 펴들지 못하는
검은 뇌와 심장을 꺼내
태어나는 것도 금에서라고
접고 또 접는다
나는 나의 인연(因緣)
집 앞 사거리에서 서북쪽으로
돌아나갈 때 종종 너를 만난다
분명 어디서 본 듯한데,
마주앉아 같은 곳을 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서로 스쳐지나 가면서도
인사를 나눌 수 없다
등 뒤로 환영이 뜨고
그 마저 사라져 보이지 않아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끊긴지를 모르겠다
오늘은 후광 환한 모습으로
웃음 가득 물고 온다
여기까지 좋아지는 기분이
천천히 와서는 횡 지나간다
첫사랑이었을까
신나는 일을 꾸미려고 만났었을까
내 어머니였을까
인사를 건네지 못하는 나는
환풍구에 서성이는 바람이다
밭에서
밭에 콩 심으려고
흙 고르고 돌 걷어낸다
서툴게 골라 던져보면 흙이다
다듬어 두둑 만들고 보면
고랑 타고 선 돌이다
돌이 스멀스멀 고랑으로 흘러내려
물길 닦는 흙이 된다
바람도 햇살도
이 밭에서는 두 몸 담그고
억센 쇠비름도 한 발은 흙에
또 한 발은 돌에 묻고 산다
밭은 내가 고른 살의 돌,
뼈의 흙이어서
씨앗들이 흐물흐물
돌 속에서 흙 먹는다
밭을 괭이로 내리찍으면
알뿌리처럼 콩밭에서 팥들이 나와
거친 풀숲으로 튕겨나가고
흙으로 있어도 돌로 있어도
이 밭에서 모든 씨앗은
무릎에 묻은 먼지 털지 않고는
일어서 나갈 수 없다
탈선
편승하려고 플랫폼에 이르렀을 때
내 눈과 마주치고도 성급히 문 닫은 너는
서두른 발길이 타야 할 자리를 실은 채
몸 덩어리만 덜렁 남겨두고 출발한다
한숨 걸러 뒤따라오는 차를 타고
앞서가며 담고 버리고 할 너를 따라간다
어디쯤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어디쯤에서 한번쯤은 추월할 수 있을까
네가 휘파람 불며 지나간 길,
네가 먼저 시끌벅적 달구었을 간이역,
몇 차례 흘려보내고도 따라잡을 수 없는
처진 뒷길에서 환기되지 않는 숨 헐떡인다
팽팽한 레일 위로 그리움만 커 가면
이렇게 놓치고 말까 아귀 물린 조바심이
네가 간 철길에 주검 없는 무덤 만들고
레일 벗어나 흙탕길로 추월을 시도한다
자꾸 뒤따라 잡히기만 하는 앞 추월
시도할 수도 없는 외진 환승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것은 가면서 온다
한밤의 고요에 세상이 멈췄나 하고
잠들지 못하는 문 열고 나서자
어둠 들추고 온통 깨어 있는 것들뿐이다
한편에서는 죽은 듯 잠 자고
한편에서는 산 밤길로 차를 몰아간다
어디로 발 들고 가는 것일까,
(차가 가는 것인가, 사람이 가는 것인가)
어디서 기척 내며 오는 것일까
(사람이 오는 것인가, 차가 오는 것인가)
만나러 짐 버리고 가는 길일까,
만나고 짐 싸들고 오는 길일까
(어디가 가는 것이고, 어디가 오는 것인가)
갔다가 손을 잡고 돌아오는 일일까,
다시는 잡지 못할 손을 놓고 가는 일일까
빛 밝혀 초행길을 달려본 이는
제 몸이 너무 커 비틀거렸던 기억 알고
운전대 잡고 펑펑 울어본 이는
달리는 길 위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알아
오늘도 달리는 것들 속에는 꾸물꾸물
발버둥치는 무엇인가 하나씩 들어앉아
전조등이 허공을 파낸 구멍으로 오고간다
잠들지 못한 구멍 없는 눈빛이 반짝,
새벽녘으로 푸르게 물드는 문 열어두고
외돌바위
너는 넓은 사위(四圍) 거느리고 있다
제 살 내줘 외발 겨우 묻고는
전망 끌어들여 치장된 화려한 몸에
바람 깃 하나 가두지 못하며
햇살에 이마 붉히는 절애(切愛),
또는 혈기 찬 살 내주기 전에
수풀들에게 곁을 더 줬더라면
반신불수의 삶은 살았을 절애(絶崖)
뻣뻣한 몸으로 심지(心志)만 세우다
제 곁에 머무를 것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풍상우로(風霜雨露)하고 있다
누군들 처음부터 벗은 몸 내놓고
부끄러움에 살비듬 날리며 살았을까
곧음이 굽은 것만 못하고
단단함이 무른 것만 못할지라도
홀로 되어 헐벗기기 전에
들여다 볼 자신 만들지 못했기 때문
풍광 업고 의연한 석림(石林)이 되어
제 멋 깊은 산맥일지 모르지만
때론 흙 곁이 그리운 수신호 같아
붙잡고 놀아줄 것 없는 허공만 외롭다